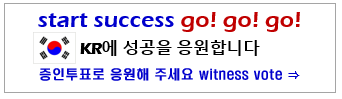[2막1장] 주요셉 시인의 시 한편 226
등대·2-------- 앤다만해로 접어들면서
졸음이 엄습한다.
초점이 희미해진다.
아무런 신호 포착되지 않는다.
항해가 불만스러워온다.
오랜 낯익음의 항로로 인해
예기치 못한 권태 끼어들고
고요한 바다,
수평선의 희미해짐처럼
해살이 역광(逆光)으로,
엔진이 괴로운 신음 호소한다.
북(北)적도 해류 따라
앤다만해(海)로 접어들면서부턴
하품이 무더기로 쏟아진다.
어디가 어딘지
동서남북 나침반으로도
기상(氣象) 관측할 수 없다.
간간이 불빛이 스쳐간다.
저마다의 살아있음으로
뱃고동 길게 안심시켜 주며
무전기가 왕왕 대화 요청한다.
어둠이 어둠에게 별빛을 전한다.
밤하늘 가득 울려 퍼지는
행성의 찬미소리
은하계 저편 하늘나라에서도
변함없는 생명이려는 듯,
별똥이 스러진다.
값는 생명의 목숨처럼
또 하나의 존재,
상실(喪失)의 세미한 의미 추억시킨다.
언젠가 우리는
저 끝 보이지 않는 우주로부터 날아와
지구의 한쪽 귀퉁이 왜소한 나라로부터
또다시 머나먼 저 은하계 속으로
우리의 안타까움 이별시키려는가.
반딧불 깜박인다.
어릴 적 고향 논두렁에서처럼
반딧불 명멸한다.
참외서리처럼 달콤한 수면(睡眠) 속으로
어김없이 발하는 경고,
새벽이 무르익는다.
광야의 종소리마냥
어디선가 불쑥 뱃고동 지나면
어릴 적 도시 변두리의 기적(汽笛)소리
아, 아직도 눈앞으로 가물거리는
그 몽롱했던 미래의 선망과 두려움…
바다는 아직
부두를 포옹하지 못한다.
Sort: Trending
[-]
successgr.with (74) 4 year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