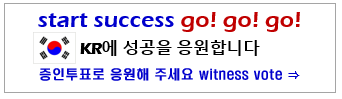[city 100] 잔스카르, 공보랑존 그리고 푹탈
잔스카르에서 가장 힘들었던 날은 망설임 없이 둘째 날이라 말할 수 있다. 15시간을 걸려 레로 돌아온 넷째 날도 물론 힘들었지만 차에 오랫동안 앉아만 있는 게 몸이 배겼을 뿐, 운전자인 싱게에 비해 힘들다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둘째 날 아침은 전날 3시까지 마신 술로 컨디션이 정말 최악이었다. 전 날 캠프파이어에서 디젤을 물로 착각해 한모금 먹은 춘자는 자꾸 트름에서 디젤 냄새가 올라온다며 호소했고 챗gpt는 당장 병원에 가라, 흡인성 폐렴이 될 수 있다. 엑스레이를 찍으라고 잔뜩 겁을 줬다. 레도 아닌 잔스카르 오지에서 병원을 갈 수 있을리는 만무했다. 나는 인도 오지라 병원을 갈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처법을 달라고 프롬포트를 적었고 챗gpt는 디젤 배출을 도와줄 인도약의 이름과 사는 방법까지 영어 문장으로 제시하면서 왼쪽으로 누우라는 현실적인 조언도 덧붙였다. 라다크인이라면 모두 한번 쯤 디젤을 마신다는 싱게의 말에 걱정이 수그러든 춘자는 왼쪽으로 눕지도 않고 태평하게 디젤과의 합일을 받아 들였다.
일정은 단촐했다. 공보랑존과 푹탈곰빠. 레 택시는 잔스카르에서 운행할 수 없다. 잔스카르 택시의 생존을 위한 법이겠지만 이로 인해 잔스카르에서는 현지 택시를 대절해야해서 투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외국인이 잔스카르 여행을 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열린 지름길로 여행 시간이 대폭 줄었지만 여전히 먼 길이라 라다키들에게도 잔스카르 여행은 꿈같은 일이다. 라다크에서 나고 자란 초모 역시 잔스카르는 초행길이었다. 곰빠 방문이 대부분이라 성지순례로 불리기도 한다는 잔스카르의 일정 속에서 가장 의아했던 곳이 공보랑존이었다. 잔스카르의 주도인 파둠에서 차로 서너시간을 달려야 하는 그곳까지 가서 꼭 삼각형 모양의 산을 봐야하나? 비포장 도로에서 어디 잡을 곳도 없는 가운데 자리에 앉아 앞뒤옆으로 끊임없이 흔들리고 숙취에 시달리며 몇번이나 그 생각을 되풀이 했다. 도착한 공보랑존은 아름다웠지만 아름다움이 전부는 아니다. 계곡 중앙에 우뚝 솟은 바위산인 공보랑존은 잔스카르의 수호신이 깃든 성산이자 티베트 불자들의 신앙의 대상이다. 멀리서 바라보면 산의 윤곽이 좌선하고 있는 밀라레빠의 형상과 닮았다고 전해지며, 그래서 종종 밀라레빠의 바위산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초모는 그 산 가까이 가서 피터는 그 산 멀리에서 산 곳곳에 새겨진 신비로운 그림들을 찾아냈다. 그 안에는 스투파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원숭이가, 미처 읽지 못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비밀을 해독하는데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천진하게 자신이 찾은 것들을 일러주는 둘의 무구함이 좋았다.
정오가 다된 시간에 허기를 느낀 우리는 공보랑존 근처의 텐트 식당에 비집고 들어갔다. 티베트인 남자 운영하는 식당이었다. 가능한 음식이 별로 없어 달과 밥, 뚝바, 계란 후라이와 커피를 시켰다. 남자는 굼뜨고 말이 많았다. 하루 중 가장 높은 곳에 오른 해의 복사열로 한껏 후끈해진 텐트는 평범하게 숨을 쉬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우리는 음식을 기다리며 텐트 안에서 서서히 익어갔다. 몸 속 장기들이 디젤과의 사투를 벌어는 춘자는 덥다고 자꾸만 뛰쳐나갔고 예로부터 꽃사랑으로 유명한 초모, 싱게 남매는 텐트 밖에 핀 보라색 꽃을 배경으로 공보랑존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나는 숨막히는 더위를 오롯이 받아들이며 텐트 안에만 있었다. 20분, 30분이 지나도 음식은 나오지 않았다. 그 때는 그 기다림이 마냥 힘들기만 했는데 돌이켜보니 그건 ‘힘든 하루’를 위한 하나의 필수불가결한 장치였다. 40분 뒤부터 하나둘 나오기 시작한 음식은 1시간이 넘어서야 전부 나왔고 모든 음식과 음료를 먹고 나니 2시간 가까운 시간이 훌쩍 넘어있었다. 별명 짓기를 좋아하는 우린 느린 사람들에게 느림의 대명사인 싱게 앙축의 이름 일부인 앙축을 부여해 부르곤 한다. 이를테면 한국 대표 느림보 지은 앙축, 네팔 대표 느림보 오주 앙축 이런 식으로. 공보랑존 앞에 텐트를 치고 장사를 하는 남자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공보였고 그는 공보 앙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푹탈 곰빠까지 가는 길은 공보랑존보다도 더한 고행이었다. 잔스카르에서 가장 상징적인 불교 유적지인 푹탈 곰빠의 “Phug”은 동굴, “tal”은 보석이라는 뜻으로, 보석의 동굴이라 해석 할 수 있다. 그 이름답게 거대한 석회암 동굴을 중심으로 절벽에 보석이 점점이 박힌 것 처럼 보이는 사원이다. 원래는 차에서 내려 1~2일 정도 트레킹을 해야 닿을 수 있는 외딴 사원이었지만 길을 정비하며 접근성이 좋아졌다. 그럼에도 서너시간은 하이킹을 해야 갈 수 있는 길이라해서 여행 전부터 바짝 긴장하고 심지어 당근에서 트레킹화까지 구매했다. 길을 들이기 위해 서울서 두어시간을 신다가 밑창이 삭아 떨어지는 바람에 결국 환불 엔딩이 되긴 했지만. 최근에 길을 더 닦아서 차가 작년보다 더 높이 운행할 수 있었다지만 산꼭대기에 있는 사원인 만큼 꽤나 걸어 올라가야 한다. 물을 건너고 산을 오르고 계단을 올라야 높은 산 속 깊숙히 숨어있는 푹탈 곰빠를 만날 수 있다. 푹탈 곰빠는 2년 전 부터 피터의 오랜 염원이었고 나도 덩달아 기대감이 커져 있었다. 멀리서 보는 푹탈 곰빠는 영상이나 사진 속에서 보던 것 보다는 규모가 작았다. 힘든 발걸음을 반복하며 도착한 푹탈 곰빠에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냄새가 지독하다.’ 사원 초입부터 참을 수 없는 오줌 찌린내가 가득했다. 살가운 남매 덕에 외국인이 들어갈 수도 없는 방들을 들어갈 수도 있었고 좋았지만 크게 기억에 남는 건 없다. 정신이 사유할 틈을 주지 않은 육체의 고단함이 그 이유일 수도 있겠다. 나는 사원을 내려오며 육체에 대해 생각했다. 최근 6개월 넘게 몸을 쓰는 알바를 했다. 반복적으로 쌓인 노동으로 몸에 새겨진 근육의 뻐근함과 관절 사이의 삐끄덕거림은 내가 발 붙이고 사는 세계가 바로 이곳임을 온 몸 절절하게 느끼게하는 지표였다. 어쩌면 라다크가 좋았던 건 이곳의 환경이 육체의 허약감과 무력감을 절실하게 주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랬다. 높은 고도의 대자연 앞에서 넝마 같이 늘어지고 쓰라린 육체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몸 구석구석 차오르는 살아있다는 감각. 그 처절한 감각이 생의 의지를 일깨웠다. 맛있다고 말할만한 음식도, 내 오감을 깨울 술도 없는 이 곳에서 모든 쾌락을 내려놓고 허약한 거죽의 무력감을 받아들인다. 소박한 먹거리를 몸에 성실하게 쌓고 내 몸의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차분히 써내려 가는 것은 라다크여서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이 날이 지나고 다음 날에 그것을 상쇄할 마법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늘 인생은 그런 법이다.